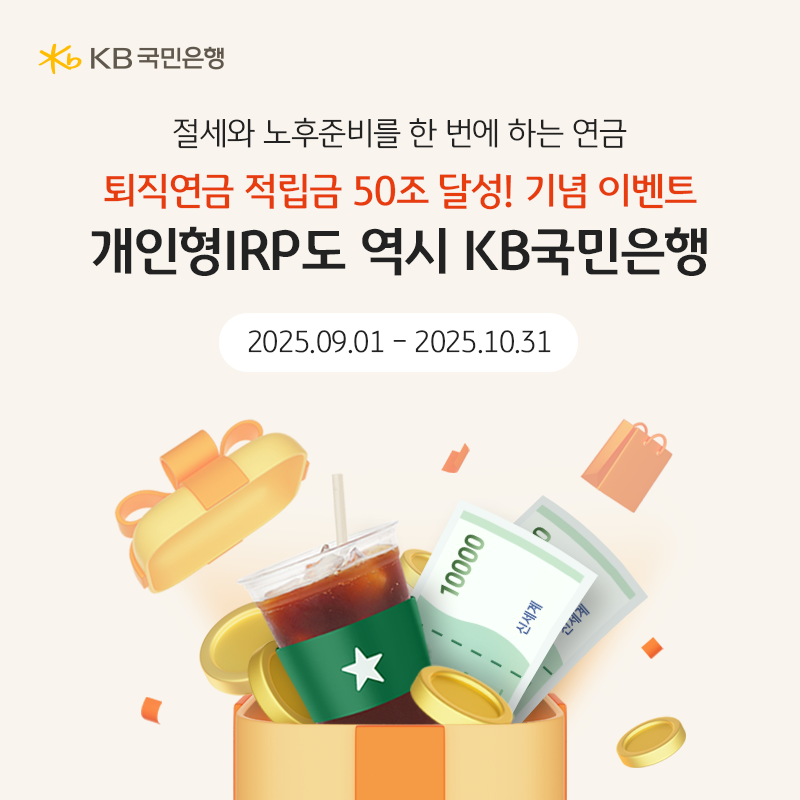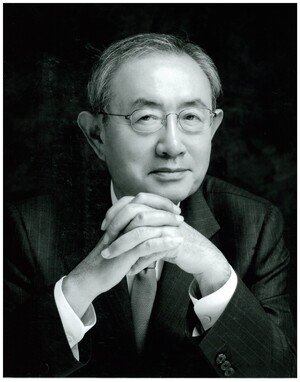직장인들은 매달 월급날이 지나면, 통장이 텅 비는 ‘텅장’을 경험하게 된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그리고 카드값까지 내고 나면 텅 빈 통장을 마주해야 한다. 수북이 쌓이는 건 각종 고지서뿐이다. 그저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정거장에 가깝다.
쓸 곳은 많은데 지갑은 홀쭉하다 보니,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유혹에 눈길이 가기도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일정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통장을 말한다. 당장 쓰지 않더라도 비상시 기댈 곳이 있다는 든든함을 준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국가 간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다. 바로 ‘통화스와프’다.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외환위기 등 비상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역 협상과 신뢰 제고를 위한 카드로도 활용된다.
계약 당사국 중 하나가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해도, 경제여건이 좋을 때 체결된 가격으로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빌려 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급한 불을 끈 적이 있다.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과도 통화스와프를 꾸준히 늘려 왔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환율 안정과 급격한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두 나라는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한다.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원)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 규모만으로는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에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스와프를 내주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원화는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 비중도 낮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보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통화스와프 체결 = 시장 안정’이라는 공식이 자리잡았다.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문제만큼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 협정을 수용할 순 없다. 투자 기간과 투자 대상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달아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식시세는 늘 있지만 최선의 매입시점과 최선의 매도시점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다.
기회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면 양쪽 모두가 손해다. 냉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김민지 경제부장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